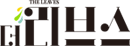증권회사는 주로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고팔기를 도와주는 등 자금을 순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유동성이라는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금리 정상화 혹은 인상 기조로 증권업이 팬데믹 이후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유동성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펴봅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은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202/2002_2839_3539.jpg)
지난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업황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인 것과 달리 올해에는 금리 정상화 내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실적 규모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동성 비율이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할지, 유동성 비율 하위사들의 추세는 어떨지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수익성 증가했지만 위험액 증가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 추이.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202/2002_2840_3551.jpg)
예금보험공사가 28일 발간한 금융리스크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수수료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위험액은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14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543억원) 대비 3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증시 호황에 따라 IPO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IB관련 수수료 수익은 1조3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4억원 늘어났으며, 달러 강세 효과로 외화 손익도 582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7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분기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및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8%p, 0.55%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이 늘어난 만큼 위험액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잉여자본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순자본비율도 크게 올랐다. 작년 3분기 기준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762.3%로 전년 동기(677.2%) 대비 85.1%p 늘었다.
그러나 이는 영업용순자본의 증가폭이 위험액 상승분을 앞지른 결과다. 위험액 상승분도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대형사의 자본 확충 영향으로 영업용순자본은 8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위험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결과 3조9255억원 증가했다.
증권사 자산총계 중 신용공여금 증가세 가장 커
![증권회사 자금조달, 운용현황.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202/2002_2841_3636.jpg)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자산총계를 보면 신용공여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해당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계는 654조7000억원인데, 이중 신용공여금은 10조8000억원 늘어났다. 채권 규모는 오히려 7분기 만에 3조9000억원 축소됐다.
증권사 부채총계는 578조9000억원으로 개인투자자 증가에 따른 예수부채가 23조9000억원 대폭 증가했다. 또한, 매도증권은 12조2000억원, 차입금은 9조6000억원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늘어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21조500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줄어든 부분을 상쇄했다.
3분기 유동성 비율 역대 최저 이어지나
![증권회사 규모별 조정유동성비율 추이.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202/2002_2842_3829.jpg)
지난해 3분기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은 118.9%로 전년 동기 대비 6.5%p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종투사가 119.5%, 대형사 112.7%, 중소형사 118.8%로 낙폭 기준으로는 대형사가 10.6%p 떨어져 가장 컸다.
여기에 유동성자산을 유동성부채 뿐 아니라 채무보증금액을 더해 나눈 조정유동성비율의 경우도 106.3%로 전년 동기 대비 4.0%p 하락했는데, 이 역시 대형사가 6.6%p 떨어진 102.2%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조정유동비율 100%를 하회하는 증권사는 5개사로 종투사 2개사, 대형사 2개사, 중형사 1개사인데, 이는 2020년 3월 말(6개) 수준으로 다시 그 개수가 늘어난 모습이다.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는 매도증권, 차입금 등 단기부채 및 대출채권과 집합투자증권 등 장기자산 증가에 따른 장단기 미스매칭 심화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월 유동성 자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3.5% 수준인데 비해, 유동성 부채 증가율은 10.8%로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조정유동성 비율 하락의 경우에는 채무보증이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금리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증권시장에 타격을 가하면 증권사들도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동성에 미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지만, 유동성 하락 추세에도 아직까지 업황에 미칠 영향력은 소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산업분석2부 자본시장분석팀 민윤홍 팀장은 “조정유동성 비율 100%를 하회한 증권사가 일부 증가했으나 비율 하락폭이 크지 않으며 조정유동성 비율이 권고 기준임을 감안하면 증권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020년 3월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있었던 사례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의 추세적 하락여부 및 유동성 비율 하위사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